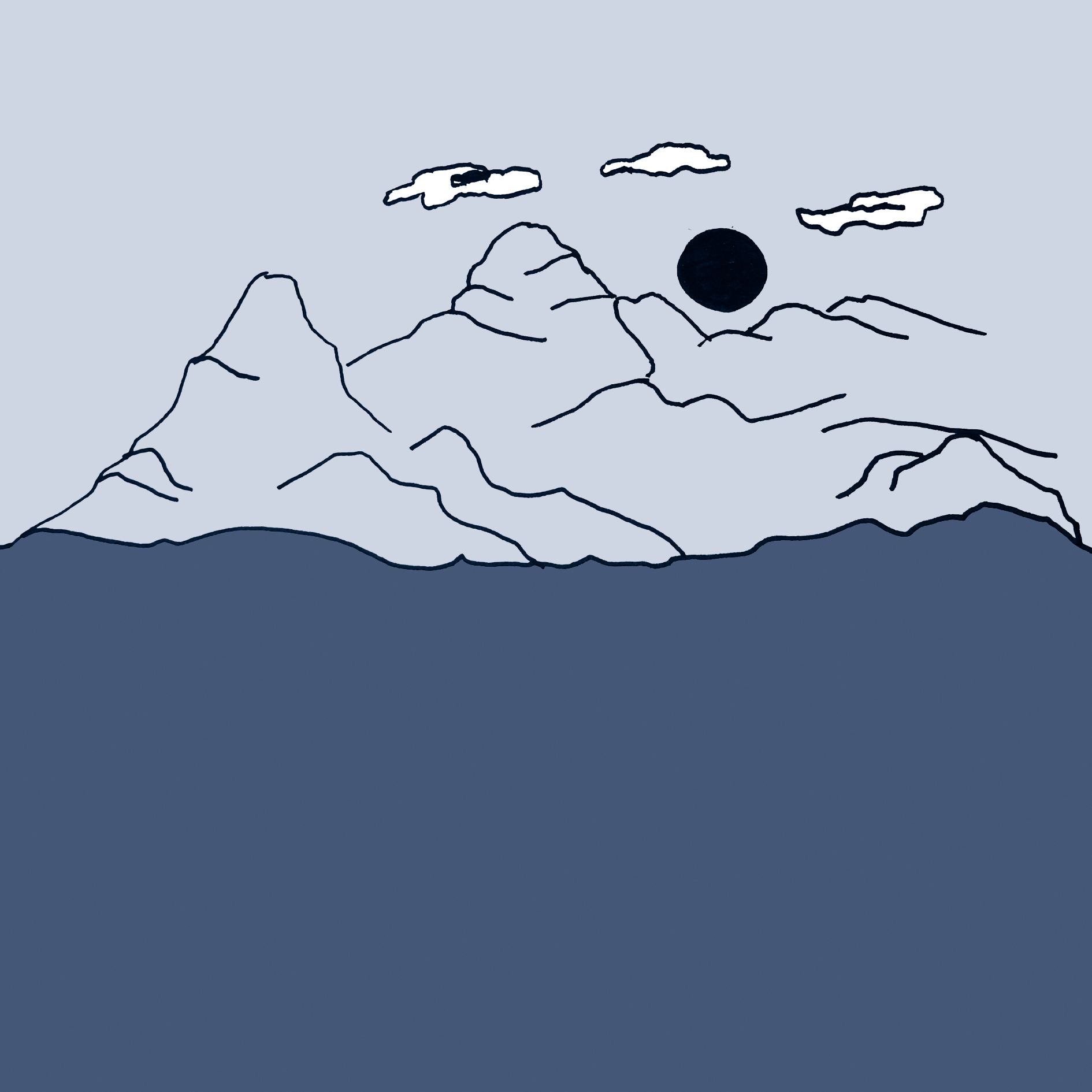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짠 냄새가 풍겼다. 그야말로 싱싱한 소금물 냄새였다. 바다는 염수다. 제 몸이 마르면 소금이 되는 물이다. 이 물은 깊고 어두운 빛깔로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 속을 아는 건 바다가 집이고, 바다가 삶의 터전인 생물들뿐이다.
나는 백령도 인근 바다 한가운데서 외롭게 솟아오른 갯바위에 누워 있는 물범을 본 적이 있었다. 물범은 사람과 배를 구경삼아 한가로이 태닝을 즐기는 중이었다.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탄성을 질렀다. 한 아이는 괴성을 지르며 물범의 눈길을 끌려고 애썼다. 하지만 물범은 어지간히 성가셔 보였다. 고개를 돌린 채 도통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다. 1)
갑자기 머리가 아플 정도의 굉음이 귓가를 찔렀다. 호루라기 소리였다. 건장하게 생긴 한 남자가 물범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호루라기를 불어댔다. 그 소리는 한동안 멈추질 않았다. 그의 행동은 주위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무뢰한’ 같아 거슬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이들은 이런 남자를 ‘상남자’라 부르기도 했다. 거침없고, 털털하고, 막말하고, 육체미와 경제력을 과시하고, 웅심한 포부를 가진 남자가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설레던 물범과의 조우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나는 팔짱을 끼고 오르락내리락하며 물보라를 쳐 대는 뱃머리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 남자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보고 싶지 않았다. 뱃머리는 큰 파도에 부딪칠 때마다 철썩하는 소리를 냈다.
불편해진 마음을 달래 준 것은 바람이었다. 상큼한 바닷바람이 호루라기 소리와 희석되며 거북해진 마음을 쓰다듬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이 멀리서 아련하게 들려왔다. 매점 아가씨가 틀어 놓은 음악이었다. 피아노 선율은 마치 처마 밑에 매달린 이슬처럼 귓가에 잔잔하게 맺혔다. 어린아이들이 갑판을 뛰어다니며 해맑게 웃는 소리도 들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짜그르르 터져 나오자 하얀 몰티즈 개 한 마리가 자기도 좋은지 덩달아 왈왈 짖었다.
흔하디 흔한 소리였다. 단 한 번도 멋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소리였다. 하지만 이날은 갖가지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멋지다는 생각과 함께 가슴이 울컥했다. 별안간 ‘만약 내가 듣지 못했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바늘에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이 엄습했다. 세상 만물이 내는 고유한 소리를 듣는 것, 이 얼마나 근사한 일이었던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미처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
어렸을 때 막연한 호기심 때문에 수화를 배워볼까 생각했다. 주위에 수화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과 친구가 되고 싶다는 바람보다는 이들을 수혜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남들 앞에서 자신을 뽐내기 위해 수화를 배우는 이들이 있었다. 수화가 청각장애인들에게 간절한 소통의 도구이자 절실한 몸짓이라는 것을 공감하지 못한 탓이었다. 나도 좋은 마음으로 덤벼볼까 했지만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 그때 그 시절 사려 깊지 못했던 마음을 되돌아보니, 물범과의 조우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됐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태어난다. 어떻게든 의미 있는 것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생이다.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큰 충격을 경험한다. 그것이 장애라면 충격의 파장은 더욱 크다. 그럼에도 삶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 답은 그래야 할 것이다. 남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으로 채우면서, 행복의 기준도 자신이 정하는 것이지 세상이 정한 척도는 아닐 테다. 문제는 다름을 대하는 자세, 차별이다.
사람은 모두 똑같은 그림자를 밟으며 살지 않는다.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과제도 다르고, 추구도 다르다. 세상에는 매우 다양한 삶이 있다. 사랑의 방식 또한 천차만별이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기도 하고, 여자가 되려는 남자도 있고, 남자가 여자처럼 살기도 한다. 그러나 모두들 다른 것 같아도 사람은 사람이다. 먹고, 싸고, 울고, 웃고, 성교하는 삶, 사는 모양이 다 그렇다. 성품이 다르고, 생긴 모양이 다르고, 젠더가 달라도 사람은 사람이다.
나는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애썼다. 진실한 자아를 찾아가는 사람의 방황과 권리에 존엄성을 가지고 싶었다. ‘다르다’는 게 무엇이기에 그토록 아픔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어느 누구에게도 타인의 삶을 평가하고 재단할 권리는 없었다. 2)
나는 못된 구석이 많아 쉽게 편견을 버릴 수 없었다. 깨달은 것이 있다면 다름에 대해 욕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욕할 필요는 없었다. 그 이상은 폭력이었다. 완력으로 억누르고 총칼로 제압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폭력은 폭력을 불렀고, 그러다 보니 끝없는 대립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1) 물범은 천연기념물 제331호다. 옛날에는 해표라고 불렸다. 목은 짧고 앞다리는 앞으로, 뒷다리는 뒤로 향해 있기 때문에 땅에서 걷기가 힘들다.
2)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누군가가 자랑스럽거나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을 때 멋지다는 뜻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 브라질에서는 엄지손가락을 들고 ‘따봉’을 외치면 최고라는 의미라고 한다. 우리는 칭찬에 인색한 것 같다. 오늘은 주위 사람들을 위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자.
내가 여행에서 찾는 소소한 기쁨이나 성찰은 자신으로 온전하게 돌아가는 길이었다. 어떤 과업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나란 사람의 역사는 이런 시간들이 모여서 완성되는 것이었다.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여행을 떠날 때마다 시간의 결핍이 주는 불만족과 긴장감은 모두 접었다. 그래 봤자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현실도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 진정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꼭 화려한 꽃과 잘생긴 사람만 멋진 것은 아니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나름의 멋과 역할에 충실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했다. 나도 개망나니지만 나름 멋진 구석도 있다고 생각했다.
'책 > 개망나니의 사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007. 바다 한가운데에서 - 진실이라는 이름 (1) | 2024.03.04 |
|---|---|
| 006. 바다 한가운데에서 - 여행의 기쁨 중에는 (0) | 2024.03.04 |
| 004. 바다 한가운데에서 - 자연사와 동등한 자살 (0) | 2023.08.25 |
| 003. 바다 한가운데에서 -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것 (1) | 2023.08.24 |
| 002. 바다 한가운데에서 - 행복을 말하지 않게 될 때 (2) | 2023.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