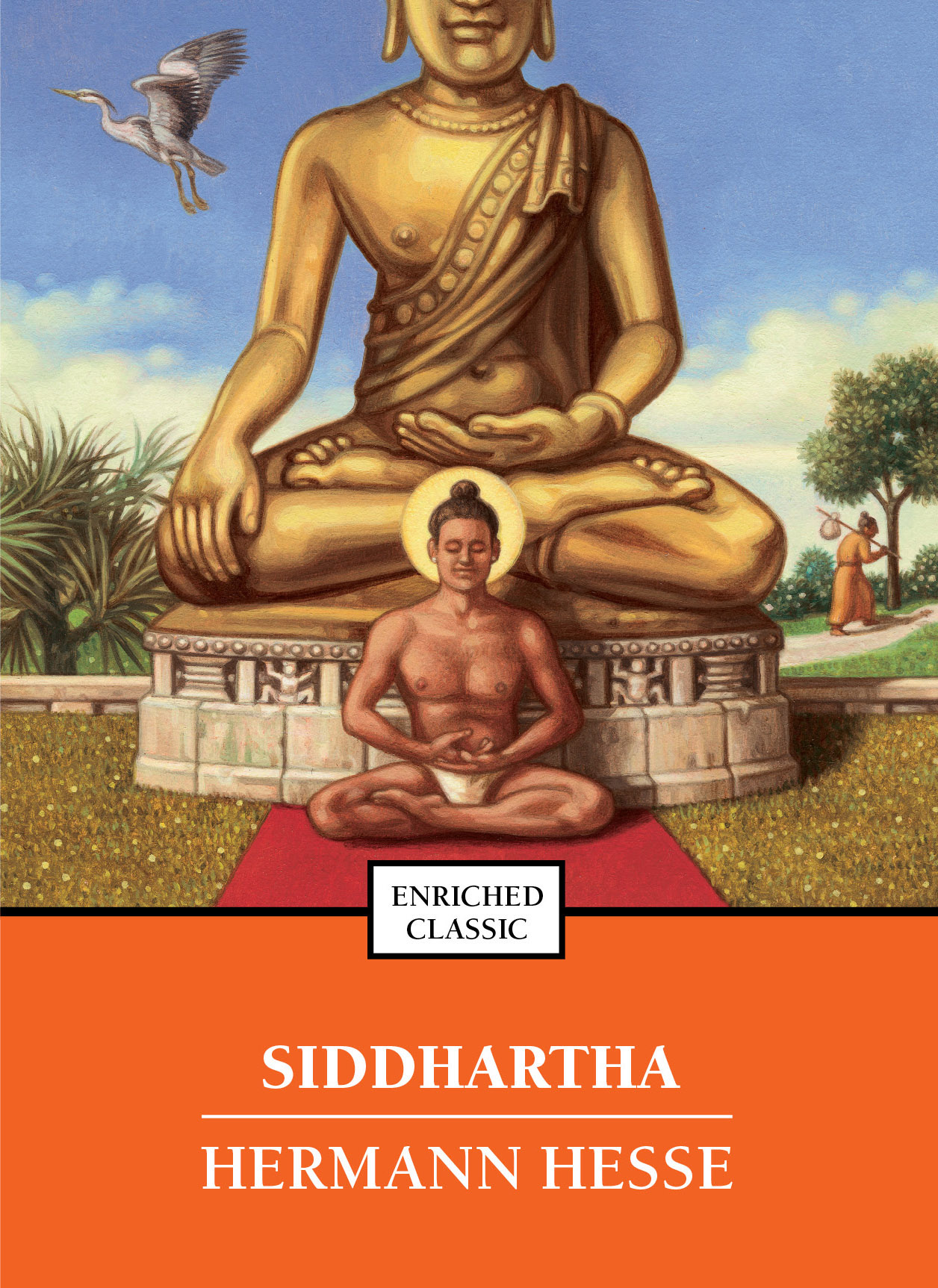
싯다르타는 브라만의 왕자로 태어나 아버지와 성현들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티 없이 맑은 정신으로 아트만(참다운 자아)의 존재를 구했다. 그는 온갖 부귀영화와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사문들 곁에서 고행하는 삶을 택했다.
넓적다리와 뺨엔 살이 빠지고 윤기 없는 털이 자라났지만 휑하고 까만 그의 눈동자에서는 지혜와 자비의 덕망이 이글거렸다.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들과 정열적인 여인의 자태는 그에게 모두 비웃음으로 번지는 것이었고, 생로병사에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 장사를 하고 몸을 팔고 사냥을 하는 모든 속세의 삶이 머무를 가치가 없이 거짓이며, 자신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위해 모두 위장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속세의 맛은 쓰고 인생은 고통이었다.
비로소 그는 텅 빈 마음으로 평정을 구하고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마음속에 깃든 모든 욕망에서 해탈했으며 대자연의 경이로움에 겸허하게 맞섰다. 이후 그는 고통과 갈증과 대속으로 상처받은 중생의 아픔을 쓰다듬고 자비의 이름으로 세상을 치유했다.
인생의 스승,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는 나의 평생 스승이다. 그와의 첫 만남(데미안)은 대단히 멋졌고 앞뒤 모르는 젊은이의 질풍을 잠재우기에 너무도 잘 어울렸다. 나는 헤르만 헤세로부터 세상에 의문을 가졌고 이치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끝없이 지혜를 갈구하면서 세상을 방랑하고자 했다. 궁극적으로는 헤르만 헤세처럼 사람들에게 그윽한 위안을 주는 글쟁이가 되고 싶었다.
헤르만 헤세의 얘기 중에서 가장 큰 가르침은 ‘삶의 덧없음을 모르는 정열은 욕망’이었다. 그는 세상을 조용히 관망할 줄 알고, 너와 나의 문제를 나눌 줄 알고, 아픔과 슬픔을 미소와 사랑으로 변용할 줄 아는 정열이야말로 ‘참된 삶’이라고 알려줬다. 이후 나는 어떻게 살던지 용기와 의지를 갖게 되길 원했다.
헤르만 헤세의 여러 소설 중에서 가장 많은 지적 호기심을 부른 책은 ‘유리알 유희’였다. 하지만 다채로운 사색과 지혜를 선사한 책은 바로 ‘싯다르타’(1922)였다. 내가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경건함과 정숙함을 추종하는 것은 바로 헤르만 헤세의 영향이 가장 크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싯다르타’는 겉으로만 읽으면 내용이 너무도 불교적이다. 그래서 불교경전 같다는 편견을 부른다. 하지만 이 책은 싯다르타가 내면의 자아를 완성해나가는 정신적 성장 과정을 그렸고, 헤르만 헤세는 거기에 자신의 세계관을 모두 다 쏟아부었다. 이 책은 그가 ‘진리는 가르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죽기 전에 문학적으로 형상화해보고 싶었던 바람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싯다르타는 이국의 풍경으로 가득하다. 고요하고 적막한 사원과 종려나무의 향기에 물든 정원에는 위로와 축복의 기운이 가득하다. 하지만 싯다르타는 이곳이 싫다. 번거로운 제식과 스승의 교조적인 가르침에 한계를 느낀다.
싯다르타는 친구 고빈다와 함께 고향을 떠나 숲 속에서 고행을 하는 사문들을 찾는다. 그들과 함께 고행을 하면서 자아를 초극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사문들도, 고행도 싯다르타와 고빈다의 커다란 정신세계를 채워주지 못한다. 이후 그들은 붓다에게 인도된다.
싯다르타와 고빈다는 붓다의 설법을 경청한다. 고빈다는 붓다의 얘기를 듣고 귀의하지만 싯다르타는 불교의 교의를 불신하며 배움을 거절한다. 싯다르타는 또다시 깨달음을 갈망하면서 세상의 가장 밑바닥 삶으로 들어간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천박한 자아를 알아보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방탕하게 살아간다. 기생 카마라에게 사랑의 기술을 배우고, 상인 카마스바미에게 부와 허세를 익힌다. 그러다 싯다르타는 밑바닥 생활을 경멸하며 도박에 몰입한다.
싯다르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궁극적인 진리는 현세에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세속의 생활에서 도망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 하지만 강에 몸을 던지려는 순간 수천 개의 눈을 가진 보디삿타바가 나타나 그를 지킨다. 싯다르타는 보디삿타바에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브라만의 성스러움 음인 ‘옴’을 듣게 된다.
싯다르타는 뱃사공 바스데바와 함께 지내면서 자아탈피의 과정을 겪는다. 싯다르타는 자신의 아들을 낳은 카말라가 뱀에 물려 죽은 소식을 듣고 죽음을 이해하게 된다. 죽음이 단절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 즉 윤회의 일면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두 세계의 종적인 테두리를 넘어서서 궁극적인 진리를 터득한다. 오랜 애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이다.
이 소설은 싯다르타의 삶을 통해 문제의 원인과 해답은 자신에게 있다고 알려준다. 혼란한 세상사에 흔들린 이유도 자신이며, 세상사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며 살라고 말한다. 깨달음 또한 자신에게 비롯한 것이지 타인에게서 찾을 수 없다고 알려준다.
이 소설에서 강은 장면을 전환시키는 주된 모티브다. 싯다르타는 흐르는 강물에서 삶의 소리, 존재자의 소리, 영원한 생성의 소리를 듣고, 강물을 통해서 단일성의 사상과 영원한 현재라는 시간의 초월, 즉 무상성의 극복을 체험한다. 강은 이 작품에서 실질적인 주인공으로, 일체의 모순이나 대립을 융화시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진리의 모체로 형상화된다. 이 강은 헤르만 헤세의 세계관이기도 하다.
'이야기 > 북적북적 책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포천 - 토박이 싱어송라이터 이지상이 들려주는 ‘포천’ 이야기 (0) | 2024.02.07 |
|---|---|
| 황야의 이리 - 무기력과 이성의 상실에 대응하는 자세 (0) | 2022.10.10 |
|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 살며 사랑하며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다 (2) | 2022.10.06 |
| 겨울 가고 나면 따뜻한 고양이 - 치유의 방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0) | 2022.10.04 |
| 나무에게 배운다 - 지혜로 삶을 성찰하는 니시오카 쓰네카즈의 잠언록 (0) | 2022.10.04 |